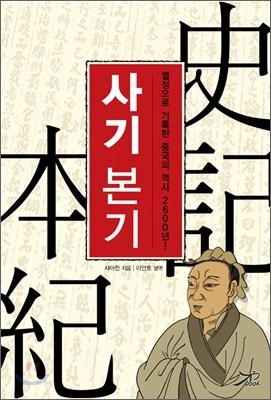당시 당나라 백성은 큰시름에 빠져 있었다. 가뭄과 함께 황충 떼들이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을 뒤덮었섰다. 가뜩이나 가뭄 때문에 고초를 겪던 백성들은 황충떼까지 창궐해, 그나마 맺힌 곡식들을 훑고 지나가자 발만 동동 굴렀다.
♡ 탄황의 고사
당 태종이 황급히 들에 나가 백성의 참상을 목격한 뒤 황충떼를 향해 소리쳤다.
“사람은 곡식으로 살아가는데, 너희가 이리 먹어대면 백성들에게 큰 해가 된다. 잘못이 있다면 모든 책임은 짐에게 있으니, 너희는 차라리 내 심장을 갉아 먹어라. 백성에게는 해가 없도록 해라.”
태종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돌발 행동을 벌였다. 들판을 메우던 황충을 손수 두마리 잡아 삼킨 것이다.
대신들이 뜯어 말렸지만 늦었다. 당태종은 “황충의 피해가 나에게만 옮겨지기를 바랄 뿐” 이라며 삼키고 말았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황충떼가 순간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것이
당 태종의 "탄황의 고사"이다.
♡ “내가 희생양이 되겠다”
비단 당태종 뿐만이 아니었다. 중국 역사를 통틀어서 국가적 재난이 발생을 할 때마다 “내탓이오”를 외친 군주들이 있었다.
‘내탓이요’의 원조는 바로 상나라를 설립한 탕왕(기원전 1600~1589)이다. 우여곡절 끝에 창업한 탕왕에게 위기가 닥쳤다. 무려 7년간이나 가뭄이 계속된 것이다.
그러자 나라 길흉을 점치던 태사 (太史)가 “사람을 제물로 기우제를 지내야 한다”고 아뢰었다.
탕왕은 “어찌 생사람을 죽일 수 있냐”면서 “내가 희생양이 되겠다”고 자청했다.
* 상나라 탕왕
탕왕은 목욕 재계하고 머리카락과 손톱을 자른 뒤 자기 몸을 흰띠풀로 싸서 희생물의 모습을 갖추고 뽕나무숲, 즉 상림에 들어가
기도를 올렸다.
탕왕은 이때 ‘6가지의 일(六事)’로 자책을 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가 무절제해서 정치가 문란해진 겁니까, 백성이 직업을 잃어서 곤궁에 빠졌습니까. 궁궐이 화려합니까. 제가 궁궐의 여인들의 청탁에 빠졌습니까. 뇌물이 많아서 정도를 해치고 있습니까. 제가 아첨을 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어진 이를 배척하고 있습니까.” (사기 ‘은본기’)
탕왕은 목욕 재계하고 머리카락과 손톱을 자른 뒤 자기 몸을 흰띠풀로 싸서 희생물의 모습을 갖추고 뽕나무숲, 즉 상림에 들어가
기도를 올렸다.
탕왕은 이때 ‘6가지의 일(六事)’로 자책을 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가 무절제해서 정치가 문란해진 겁니까, 백성이 직업을 잃어서 곤궁에 빠졌습니까. 궁궐이 화려합니까. 제가 궁궐의 여인들의 청탁에 빠졌습니까. 뇌물이 많아서 정도를 해치고 있습니까. 제가 아첨을 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어진 이를 배척하고 있습니까.” (사기 ‘은본기’)
그렇게 탕왕이 간절한 자책 기도를 올리자 금방 천리에 구름이 몰려들어 비를 뿌렸다. 덕분에 수천리의 땅이 해갈되었다. 탕왕이 가뭄을 맞아, 상림에서 6가지 자책했다고 해서 ‘상림육책(桑林六責)’ 혹은 그냥 ‘육사 (六事)의 자책’이라고 한다.(십팔사략. 제왕세기. 사문유취등)
상 탕왕과 당 태종을 섞어서 벤치마킹을 한 황제가 있었으니, 바로 송나라 태종 (재위 976~997)이다.
송 태종은 황충떼가 하늘을 뒤덮자 ‘하늘의 노여움을 산 것은 곧 짐(태종) 책임 이라고 자책하면서 역시 돌발행동을 벌였다. “짐이 내 몸을 태워 하늘의 견책에 응답을 하고자 한다”고 자기 몸에 불을 붙이려 했다.
* 송나라 태종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다, 바로 비가 내리고 황충의 떼가 즉시 죽은 것이다. 비단 중국 뿐만 아니다. 조선 임금들도 상나라 탕왕과 당태종, 송태종 고사를 줄기차게 인용했다.
영조는 1765년부터 3년 이상 계속 가뭄이 이어지고 황충떼가 창궐을 하자 ‘당태종의 탄황’ 고사를 인용하며 한탄했다.
“당 태종은 백성들을 위해 황충를 삼켰는데 아무리 어진 군주라도, 정성이 없었더라면 어찌 목구멍으로 넘어갔겠느냐.
그러나 이제 늙어버린 과인이 당 태종처럼 할 수 있을 지 걱정이다.”(영조실록, 1765)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다, 바로 비가 내리고 황충의 떼가 즉시 죽은 것이다. 비단 중국 뿐만 아니다. 조선 임금들도 상나라 탕왕과 당태종, 송태종 고사를 줄기차게 인용했다.
영조는 1765년부터 3년 이상 계속 가뭄이 이어지고 황충떼가 창궐을 하자 ‘당태종의 탄황’ 고사를 인용하며 한탄했다.
“당 태종은 백성들을 위해 황충를 삼켰는데 아무리 어진 군주라도, 정성이 없었더라면 어찌 목구멍으로 넘어갔겠느냐.
그러나 이제 늙어버린 과인이 당 태종처럼 할 수 있을 지 걱정이다.”(영조실록, 1765)
* 영조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는 것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끝까지 완수한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의미한다.
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업우를 완수한다는 의미보다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긴 일에 대해서 ‘결과를 떠맡는다’ 라는 과거를 정리, 청산한다는 의미를 지닐 때도 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는 것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끝까지 완수한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의미한다.
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업우를 완수한다는 의미보다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긴 일에 대해서 ‘결과를 떠맡는다’ 라는 과거를 정리, 청산한다는 의미를 지닐 때도 있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책임져라’ 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의미가 조금 독특하다.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경우일 때가 대부분이다.
나는 이런 우리나라 정치에서의 ‘책임론’을 볼 때마다, 우리처럼 인재가 귀하고 실패에 대해 관대하지 못한 나라도 아주 드물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매번 리더들에게 책임을 물어서 ‘사퇴’를 촉구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 절차가 된듯 싶다. 자신도 완벽치 못하면서 무슨 근거로 리더에게는 완벽이란 잣대를 들이대는가?
매우 못마땅하면서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최근 우리 리더들 중에 자신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 했던 리더가 누가 있는가? 그러니 민초들이 들고 일어설 수밖에...
이제는 "내탓이오"하면서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며, 자신이 적극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은 리더든 아니든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고질병? 중에 하나인 '대충대충'이나 '좋은게 좋은거' 하는 부정적인 업무 처리 자세가 사라지고 주인의식이 제고돼, 상호 신뢰하는 사회가 구축될 것이다.
'경영관리 > CEO'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장하준 케임브리지大 교수 "IMF·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전시상황" (0) | 2020.03.20 |
|---|---|
| 한민족의 얼굴? (0) | 2020.03.06 |
| 국민 우롱 ‘거짓과 교언’ 오래 못 간다 (0) | 2020.02.21 |
| 오만은 반드시 심판당한다 (0) | 2020.02.21 |
| 돼지 저금통 (0) | 2020.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