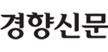[경향신문]


지난주 미국 공군의 한 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RC-135 리벳 조인트라는 이 정찰기는 보잉사가 개발해 많이 판매한 보잉 707의 축소판이다. 그래서인지 겉모습은 여객기와 매우 닮았다. 하지만 이 비행기는 통신정보 수집을 주임무로 하는 첨단 전자정보 정찰기다. 귀 밝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얘기를 쉽게 듣는 것처럼 RC-135는 북한의 동향을 감시한다.
정찰기의 핵심은 은밀성과 생존성이다. 상대와 싸움을 벌이는 게 아니라 상대를 엿듣고 엿본 뒤 안전하게 돌아와야 한다. 이 때문에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정찰기 개발 초기 시점에선 초고공을 비행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적의 전투기가 닿지 않는 고도를 날면 정찰기의 존재가 드러난다고 해도 손쓸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에서 개발된 것이 바로 U-2이다. 1955년 첫선을 보인 U-2 정찰기의 첫인상은 일반적인 비행기와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기체 길이가 13m인데, 날개 길이는 두 배에 달하는 27m에 이른다. 장거리 비행을 하는 바닷새인 앨버트로스처럼 날개가 특이하리만치 길다. 엔진을 끄고도 충분히 활공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특징은 최대 비행고도인데, 무려 21㎞나 된다. 대략 10㎞ 상공을 나는 국제선 여객기보다 두 배 높다. 이렇게 높은 곳을 날다 보니 조종사의 옷과 헬멧도 일반적인 전투조종사의 것과는 다르다. 머리와 목까지 감싸는 동그란 헬멧과 몸 전체를 튜브처럼 덮어 보호하는 U-2 조종사의 조종복은 영락없는 우주복이다.

U-2의 높은 비행고도는 정보전에서 이길 수 있는 압도적인 우위를 미국에 선사했다. 상대의 주먹이 닿지 않는 곳에서 상대를 찬찬히 뜯어보는 것처럼 U-2가 비행하는 21㎞ 상공은 당시 동구권 국가의 전투기로는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는 건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1960년 소련 국토 깊숙한 곳을 비행하던 U-2가 격추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사이 발전한 지대공 미사일, 즉 땅 위에서 비행기를 향해 발사되는 미사일이 U-2 전성시대를 끝낸 것이다.
하지만 첨예한 냉전이 이어지던 당시 상황은 또 다른 항공 기술을 발전시키는 동력이 됐다. 소련의 움직임을 알아내는 데 목말라하던 미국이 선택한 건 초고속 정찰기였다. 순식간에 적의 영공에 들어갔다가 빠져 나와 격추할 시간 자체를 주지 않는 전략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SR-71이라는 초고속 정찰기다. 최대 속도는 무려 마하(음속의 단위) 3.3이다. 1965년 개발된 이래 지금까지 실용화된 다른 기체 가운데 SR-71을 속도에서 이기는 비행기는 없었다. 이 정도 속도로 비행하면 기체 온도가 수백도로 상승하기 때문에 티타늄 합금을 사용하는 기술적인 진보도 이뤄졌다. 냉전이 끝나면서 이런 초고공, 초고속 정찰기의 수요는 예전만 못한 게 사실이다. 인공위성이 발달하면서 조종사의 생존과 국제분쟁이라는 위험 부담을 안고 정찰기에 의존할 이유도 줄어들었다. 실제로 U-2는 무인 정찰기에 소임을 상당히 넘겨줬고, SR-71은 이미 1998년에 완전히 퇴역했다.
하지만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을 콕 찍어 적의 동태를 감시해야 할 경우 여전히 정찰기만 한 존재는 없다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개발 중인 신형 정찰기가 바로 SR-72이다. SR-71과 숫자만 살짝 다른 것은 초고속 정찰기의 정체성을 이어받는다는 ‘인증’이다.
SR-72는 무려 마하 6으로 비행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기 위해선 기존에 쓰이던 제트 엔진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스크램제트 엔진이다. 스크램제트 엔진은 보통 제트 엔진처럼 공기를 압축하지 않는다. 대신 엔진 내부를 빠르게 통과하는 공기에 연료를 섞어 불을 붙인 뒤 거기서 나오는 배출가스의 힘으로 비행한다. 이렇게 공기를 압축하지 않아도 되는 건 충분히 빠른 속도로 엔진 내부를 지나는 공기가 큰 압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스크램제트 엔진의 가장 큰 약점은 공기 압축이 필요 없을 정도로 빠르게 날기 전, 즉 마하 4 이하에선 작동이 안된다는 데 있다. 지상에서 발사되는 순간엔 로켓처럼 다른 엔진을 쓰다 속도가 붙은 뒤에야 스크램제트 엔진에 점화를 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는 “성격이 다른 두 엔진을 한데 묶는 건 상당한 난제”라면서 “아직 안정화된 스크램제트 엔진 기술을 선보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
'교육자료 > 잡학사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나도 모르게 車를 망치고 돈도 잃는 행동들 (0) | 2019.06.28 |
|---|---|
| 제헌국회 개원식장 대표기도 (0) | 2019.06.22 |
| 초고령사회 (0) | 2019.05.03 |
| 선관위·대법원 이어 헌재까지 장악… "주류세력 교체" 완결판 (0) | 2019.04.26 |
| 상아미선 (0) | 2019.04.17 |